‘2008 박물관대학’
군사사(軍事史)를 통한 황산벌전투 복원
Ⅰ. 서 론(序 論)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계 전쟁사는 대부분 근세 서양학자들이 복원한 것들이다. 이들은 복원을 위해 기록과 경험 및 정보를 활용했다. 전쟁기록에 군사사(軍事史) 관련경험과 정보를 대입(代入)하여 그 동안 의문시 되었거나 제기되었던 과제들을 해결하고 관련 지식을 새롭게 이끌어 냈다. 그리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록상의 잘못된 오류(誤謬)를 식별하고 불필요한 잡초(雜草)를 제거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고자 했다.
근세학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군사사 과제(課題)들은 다름 아닌 양측(兩側)의 투입부대수, 투입부대의 편제 및 병력수(兵力數), 군량(軍糧), 행군능력, 수송능력, 전투대형 등이었다. 즉 양측 국가들이 전투에 투입하였던 정확한 전투부대수, 투입부대들이 무장하고 있던 편제 무기 및 장비 그리고 부대를 구성하고 있던 편제 병력수(兵力數), 아울러 병사들에게 제공하였던 군량(軍糧)과 우·마(牛·馬)에게 공급했던 마초량(馬草量)이었다. 더불어 양측 전투부대들이 하루에 이동할 수 있었던 행군거리와 치중대(輜重隊)가 하루에 운반할 수 있었던 군수물자의 규모 등이었다. 또한 부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투대형이었다.
근세학자들이 투입부대수 및 병력수(兵力數)와 군량(軍糧), 행군능력, 수송능력 전투대형 등을 먼저 밝히려 했던 이유는 이들이 전쟁복원에 필수적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투입부대수 및 병력수는 부대의 규모와 전투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요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량은 병사들과 우·마(牛·馬)가 전장(戰場)에서 생존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열량(熱量)을 제공하는 공급원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량은 단위부대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최소 보급량과 하루에 운반해야 할 최소 수송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특정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군량의 규모는 그 부대가 전장에서 얼마나 오래 동안 전투를 지속(持續)할 수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긴요 요소였기 때문이다. 또한 행군능력과 수송능력은 부대의 병력과 무기(武器), 장비(裝備), 물자(物資) 등을 유리한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전투대형은 양측이 최종적으로 부대를 전개시켰던 작전개념, 부대배치, 전투수행과정, 승패의 원인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요소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서양의 전쟁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 전쟁을 복원하는 데도 반드시 선결(先決)해야 할 필수(必須) 요소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신라가 서기 660년 대백제전(對百濟戰)을 수행할 당시, 전쟁에 투입하였던 신라군의 부대수(部隊數), 투입부대의 편제 및 병력수(兵力數), 전투대형(戰鬪隊形)을 복원하고자 한다.
신라(新羅)는 백제(百濟)와 서기 660년 음력 7월 9일(양력 8월 20일) 황산벌(黃山原)에서 최초의 전투를 치렀다. 황산벌전투와 관련하여 삼국사기는 “신라가 출동시켰던 병력수가 50,000명이었다”고 전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전쟁을 연구하는 군사사가(軍事史家)들은 이 5만 병력이 신라가 대백제전에 동원하였던 병력이었는지, 황산벌전투에 투입하였던 병력이었는지를 확실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리고 신라가 출동시켰던 50,000명이라는 병력수가 정말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삼국사기 기록에서 직접적으로 얻기는 어렵다. 다만 삼국사기가 전하고 있는 관련기록과 그리고 기타 사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정확한 답(答)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라(新羅)가 서기 660년 대백제전(對百濟戰)을 수행할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단위부대수(單位部隊數)를 우선 밝히고 이를 토대로 각개 단위부대들의 편제와 병력수를 차례로 규명함으로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가 [권 제40 잡지(雜志) 9 직관 하(職官 下) 무관(武官) 범군호(凡軍號) 조(條)]에서 전하고 있는 23군호를 구성하고 있는 부대수가 80개이고 [신라본기, 열전, 제9 직관하(職官下) 무관(武官) 제군관조(條)]에서 전하고 있는 23군호에 포함되지 않는 단위부대 수가 11개이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삼국사기가 전(傳)하는 신라의 단위부대 수는 91개에 이른다.
여기서 우리는 삼국사기가 전하고 있는 91개 부대가운데 서기 660년 대백제전 당시에 존재하였던 부대들의 명칭과 부대수를 식별해야 한다. 91개 부대들의 설치시기(設置時期)와 부대활동(部隊活動)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식별할 수 있다.
신라가 서기 660년 대백전쟁을 수행하였을 당시 보유하였던 부대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신라는 육정(六停)으로 발전하였던 대당(大幢), 상주정(上州停), 귀당(貴幢), 한산정(漢山停), 우수정(牛首停), 하서정(河西停), 하주정(下州停) 등 7개 부대를 서기 660년 이전에 창설하여 서기 660년 대백제전 당시에 이 부대들을 보유하였다. 그리고 구서당(九誓幢)가운데 서당(誓幢)과 낭당(郎幢)을 보유하였다. 구서당(九誓幢)가운데 나머지 7개 부대는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창설하였던 부대들이었다.
십정(十停)으로 발전하였던 부대들 가운데 음리화정(音里火停), 삼량화정(參良火停), 소삼정(召參停), 남천정(南川停), 골내근정(骨乃斤停), 벌력천정(伐力川停), 이화혜정(伊火兮停) 등은 신라가 서기 660년 이전에 창설하였던 부대들로서 신라가 서기 660년 백제와 전쟁을 수행할 당시에 이들을 보유하였을 것이다.
신라는 급당(急幢)을 진평왕 27년(서기 605년)에 창설하였고, 계금당(罽衿幢)을 무열왕 1년(서기 654년)에 창설하였다. 아울러 급당(急幢), 계금당(罽衿幢)을 서기 660년 대백제전쟁을 수행할 당시에 보유하였다. 신라는 사천당(四千幢)을 진평왕 13년(서기 591년)에 설치하였고 서기 660년 대백제 전쟁을 수행할 당시에 보유하였다.
또한 대장척당(大匠尺幢)을 법흥왕대에 설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는 대장척당(大匠尺幢)을 서기 660년 대 백제전쟁을 수행할 당시에도 보유하였으나 육정급부대(六停級部隊)와 귀당, 서당, 낭당 등과 같은 제병협동부대에 예속시켜 운용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는 대장척당(大匠尺幢)을 독립부대로 운용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단위 부대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신라는 군사당(軍師幢)을 진평왕 26년(서기 604년)에 만들었다. 서기 660년 대백제전을 수행할 당시에도 군사당을 보유하였다. 신라는 백관당(百官幢), 사설당(四設幢 : 노당弩幢, 운제당雲梯幢, 충당衝幢, 석투당石投幢) 등을 법흥왕대에 설치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부대들은 소규모법당을 예하부대로 거느리고 있는데 신라는 소규모 법당을 법흥왕 당시에 설치하였다. 신라는 서기 660년 대백제전을 수행할 당시에 이 부대들을 보유하였을 것이다.
신라는 한산주궁당(漢山州弓幢)을 진평왕 13년(서기 591년)에 하서주궁당(河西州弓幢)을 진덕왕 6년(서기 652년)에 설치하였다. 서기 660년 대백제전 당시에 신라는 한산주궁당(漢山州弓幢)와 하서주궁당(河西州弓幢)을 보유하였다.
삼국사기는 신라가 대백제전을 수행하면서 시위부(侍衛府), 웅현정(熊峴停), 시이곡정(始飴谷停) 등을 운용하였던 것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라는 이 부대들을 서기 660년 이전에 창설하였을 것이며, 서기 660년 대백제전 당시에 이들 부대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웅현정(熊峴停)은 문무왕이 왕 1년 (서기 661년)에 옹산성(甕山城) 전투시 왕(王)이 머물렀던 부대였다. 웅현정(熊峴停), 시이곡정(始飴谷停) 등은 여갑당, 외여갑당, 법당, 외법당 등에 예속되어 있었던 부대들로서 독립부대는 아니다. 따라서 웅현정, 시이곡정을 단위부대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신라는 오주서(五州誓)를 문무왕 13년(서기 672년)에 창설하였다. 그리고 삼주서(三州誓), 경오종당(京五種幢), 이절말당(二節末幢), 만보당(萬步幢), 중당(仲幢), 개지극당(皆知戟幢), 구칠당(仇七幢), 삼변수당(三邊守幢), 신삼천당, (新三千幢), 비금당(緋衿幢) 등을 서기 660년 이후에 창설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서기 660년에 존재하였던 단위부대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신라는 소규모삼천당(小規模三千幢), 흑의장창말보당(黑依長槍末步幢), 저금기당(著衿騎幢) 등의 부대를 육정(六停)과 서당(誓幢), 십정(十停), 사천당(四千幢), 군사당(軍師幢)과 같은 대부대(大部隊)에 예속시킨 단위부대(單位部隊)로 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부대들을 신라가 독립적으로 운용하였던 부대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 부대들을 단위부대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라는 진평왕 51년(서기 629년)에 김유신을 중당당주(中幢幢主)로 임명하여 중당(中幢)을 낭비성(娘臂城)전투에 투입하였다. 이후 중당에 대한 기록을 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들 부대들을 단위부대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낭당(郎幢)과 서당(誓幢)은 서기 660년을 전후하여 여러 전투에 참가하였던 부대들로 전투활동과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대들이다. 그래서 이들 부대들을 단위부대 수에 포함시켰다. 수군(水軍)은 신라가 서기 660년 대백제전을 수행할 당시 100척의 병선을 이끌고 전쟁에 참전하였던 부대였다. 이를 단위부대 수에 포함 시켰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신라가 서기 660년 대백제전을 수행할 당시에 보유하였던 단위부대수(獨立部隊數)는 36개였다.
Ⅱ-2. 신라가 [신라•고구려 국경지역에 배비시켜 놓았던 잔류부대(殘留部隊)의 수(數)]와 [대 백제 전쟁에 동원하였던 부대의 수(數)]를 규명
신라는 서기 660년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모든 부대를 대백제전(對百濟戰)에 투입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라가 모든 부대를 백제전(對百濟戰 : 서기 660년 음력 5월 26일-음력 11월 22일)에 투입하였을 경우 신라는 고구려 국경지대를 군사적으로 무방비(無防備) 상태로 남겨 두어야 했을 것이다. 신라가 고구려 국경지역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고 백제와 전쟁을 수행했다면 고구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경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신라의 배후를 공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신라는 배후의 위기를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 대백제전(對百濟戰)에 투입하였던 부대를 회군(回軍)시켜야 했을 것이다.
신라는 이러한 판단아래 고구려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부 부대를 신라․고구려국경지역에 잔류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를 대백제전(對百濟戰)에 투입(投入)하였을 것이다. 신라가 대백제전(對百濟戰)을 수행하면서 고구려․신라 국경지역에 일부부대를 잔류시키고 나머지 부대를 대백제전(對百濟戰)에 투입(投入)하였던 사례(事例)를 삼국사기가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는 신라가 진평왕대부터 문무왕대에 이르기까지 대백제전(對百濟戰)과 대고구려전(對高句麗戰)을 수행하면서 일부 부대를 잔류시키고 나머지 부대를 전장(戰場)에 투입하였던 사례를 전하고 있다.
신라가 진평왕대부터 문무왕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전역(戰役)에서 투입하였던 부대명칭과 부대규모를 살펴보자.
첫째 진평왕 46년(서기 624년) 음력 10월 백제 군사가 신라의 속함성(速含城)·앵잠성(櫻岑城)·기잠성(歧岑城)·봉잠성(烽岑城)·기현성(旗縣城)·용책성(冗柵城) 등 여섯 성을 에워쌌을 때 신라가 대백제전에 투입하였던 부대명칭과 부대수를 살펴보자.
둘째는 무열왕 8년(서기 661) 봄 2월에 백제의 남은 적들이 사비성을 공격해 왔을 때 신라가 음력 2월부터 음력 4월 19일까지 구백제지역에 투입하였던 부대명칭과 부대수를 분석해 보자.
셋째는 문무왕 원년(서기 661) 음력 6월 당나라의 요청을 받고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하여 음력 7월 17일부터 음력 10월 29일까지 동원하였던 부대명칭과 부대수를 검토해 보자.
넷째는 문무왕 8년(서기 668) 음력 6월 21일부터 음력 9월 21일까지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으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을 때 신라가 동원하였던 부대명칭과 부대수를 분석해 보자.
[신라가 서기 661년 2월 - 4월 19일 백제 부흥군이 사비성 공격시 투입부대], [신라가 661년 7월17일 - 서기 661년 10월 29일 당의 요청으로 동원하였던 부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가 백제와 전쟁을 했을 경우 첫째 신라는 ⌜한산정(漢山停), 우수정(牛首停), 하서정(河西停), 골내근정(骨乃斤停), 벌력천정(伐力川停) 등을 현지에 잔류시켰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신라가 ⌜대당(大幢), 상주정(上州停), 귀당(貴幢), 하주정(下州停), 서당(誓幢), 낭당(郎幢) 등을 백제지역에 투입하였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셋째 신라는 한산주지역에 남천정(南川停) 골내근정(骨乃斤停) 등 2개의 십정급(十停級) 부대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두 부대가운데 남천정(南川停)만을 백제지역에 투입하였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신라가 대백전을 수행하면서 통상 투입하였던 부대와 통상 잔류시켰던 부대를 고려할 경우, 신라가 660년 대백제전을 수행할 당시 투입하였던 부대는 육정과 9서당(九誓幢)가운데 대당(大幢), 상주정(上州停), 귀당(貴幢), 하주정(下州停), 서당(誓幢), 낭당(郎幢)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산주에 위치해 있던 남천정(南川停), 골내근정(骨乃斤停) 등 2개의 십정급(十停級) 부대가운데 남천정(南川停)을 투입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신라가 한산주(漢山州)에 배치하였던 남천정(南川停)과 골내근정(骨乃斤停) 등 2개의 십정급(十停級) 부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십정급(十停級) 부대(部隊)의 투입여부를 분석해 보자. 5개 십정급(十停級) 부대(部隊)는 다음과 같다.
즉 음리화정(音里火停 : 상주上州 今 경북 상주시尙州市 청리면靑里面), 삼량화정(參良火停 : 하주下州 今 경남 밀량시 삼량진읍), 소삼정(召參停 : 하주下州 今 경상북도慶尙南道 함안군咸安郡 군북면郡北面 원북리院北里 방어산 고성防禦山古城), 벌력천정(伐力川停 : 우수주牛首州 今 강원도江原道 홍천군洪川郡 홍천읍洪川邑), 이화혜정(伊火兮停 : 하서주河西州 今 경상북도 청송군靑松郡 안덕면安德面 명당리明堂里) 등이다.
삼국사기는 신라가 이들 5개 십정급(十停級) 부대(部隊)를 대백제전에 투입하였다.⌟는 기록을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라가 한산주에 배치해 놓았던 남천정(南川停 : 십정급 부대)을 대백제전에 투입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라는 서기 661년 당시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한산주(漢山州) 내에 한산정(漢山停)과 남천정(南川停), 골내근정(骨乃斤停), 계금당(罽衿幢), 급당(急幢), 사천당(四千幢) 등 6개 부대를 배치하였는데 고구려의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산정(漢山停)과 골내근정(骨乃斤停), 계금당(罽衿幢), 급당(急幢), 사천당(四千幢) 등 5개 부대를 현지에 잔류시켰고 남천정 1개 부대만을 대백제전에 투입하였다.
신라가 서기 661년 한산주(漢山州)에 주둔해 있던 남천정을 대백제전에 투입한 것은 대백제전(對百濟戰)에 가급적 최대한의 부대를 투입하기 위해서였다. 서기 661년 신라가 남천정을 백제지역에 투입하였다면 신라는 서기 660년 대백제전시에도 남천정을 대백제전에 투입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가 서기 660년 국경을 접하고 있던 한산주 내의 남천정까지 대백제전에 투입하였다면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던 상주(上州)의 음리화정(音里火停 : 금今 경상북도 상주尙州 청리면靑里面)과 하주(下州)의 삼량화정(參良火停 : 금今 경상남도 밀양시密陽市 삼량진三良津), 하주(下州)의 소삼정(召參停 : 금今 경상남도慶尙南道 함안군咸安郡 군북면郡北面 원북리院北里 방어산고성防禦山古城) 등도 대백제전에 투입하였을 것이다.
신라는 이들 음리화정(音里火停), 삼량화정(參良火停), 소삼정(召參停)을 대백제전에 투입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군사적 제약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국경으로부터 약 250km 후방에 위치해 있던 하서주(河西州)의 이화혜정(伊火兮停 : 今 경상북도 청송군靑松郡 안덕면安德面)을 대백제전에 투입하는데 별다른 군사적 어려움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신라는 서기 660년 대백제전시 벌력천정(伐力川停 : 우수주 今 강원도 홍천군洪川郡 홍천읍洪川邑)은 우수정(牛首停)과 함께 당시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우수주(牛首州)에 위치해 있었을 뿐 아니라 고구려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신라가 대백제전에 벌력천정(伐力川停)을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신라는 서기 660년 당시 보유하고 있던 7개의 십정급(十停級) 부대(部隊) 가운데 골내근정(骨乃斤停 : 今 경기도 여주시), 벌력천정(伐力川停 : 今 강원도 홍천읍) 등 2개 부대를 현지에 잔류시켰을 것이고 남천정(南川停 : 경기 이천), 음리화정(音里火停 : 경북 상주), 삼량화정(參良火停 : 경북 밀양시 삼량진), 소삼정(召參停 : 경북 함안군 군북면), 이화혜정(伊火兮停 : 경북 청송군 안덕면) 등 5개 부대를 대백제전에 투입하였을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는 신라가 서기 660년 대백제전을 마치고 논공행상을 하였던 기록을 전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신라가 한산주지역에 있었던 계금당(罽衿幢)을 백제전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신라는 특수 기술병과부대였던 사설당(四設幢)을 모든 전쟁에 투입하였을 것이다. 사설당(四設幢)은 공성용(攻城用) 기술과 우수한 장비를 갖춘 최정예부대였으므로 신라는 이들을 전시(戰時)마다 전장에 투입하였을 것이다. 실제 이들 부대의 지원없이는 일반 보병부대가 적의 성(城)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라의 군사력 운영개념을 기초로 신라가 서기 660년 대백제전에 투입하였던 부대명칭과 부대수를 식별하면 투입 부대수는 20개였다.
Ⅱ-3. 신라(新羅)가 서기 660년 대백제전(對百濟戰)에 투입하였던 부대(部隊)들의 편제(編制)와 병력수(兵力數), 전투대형(戰鬪隊形)
신라가 서기 660년 대백제전(對百濟戰)에 투입하였던 부대들의 병력수를 밝히기 위해서는 투입부대(投入部隊)들의 편제(編制)와 병력수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는 무관(武官) 범군호(凡軍號)와 제군관(諸軍官) 조(條)에서 23군호(二十三軍號)를 구성(構成)하고 있는 제군관(諸軍官)들의 수(數)와 예속부대(隸屬部隊)의 수(數)를 전하고 있다.
삼국사기가 전(傳)하고 있는 제군관(諸軍官)의 수(數)와 예속부대(隸屬部隊)의 수(數)를 토대로 투입부대들의 편제(編制) 및 병력수(兵力數)를 규명해 보자.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대당(大幢)에 장군(將軍) 4명, 대관대감(大官大監) 5명, 제대감(隊大監) 3명, 제감(弟監) 5명, 감사지(監舍知) 1명, 소감속대관(少監屬大官) 15명, 소감영보병(少監領步兵) 6명, 화척속대관(火尺屬大官) 15명, 화척영보병(火尺領步兵) 6명, 군사당주(軍師幢主) 1명, 대장척당주(大匠尺幢主) 1명, 보기당주(步騎幢主) 6명, 흑의장창말보당주(黑衣長槍末步幢主) 30명, 군사감(軍師監) 2명, 대장척감(大匠尺監) 1명, 보기감(步騎監) 6명을 편성하고 있었다.
신라가 대당(大幢)에 편성하였던 제군관(諸軍官)의 수(數)를 더하면 군관수(軍官數)는 모두 60명이다. 그리고 신라는 대당(大幢)에 군사당(軍師幢) 1개, 대당척당(大匠尺幢) 1개, 보기당(步騎幢) 6개, 흑의장창말보당(黑衣長槍末步幢) 30개 등 모두 38개의 소규모 당급부대(幢級部隊)를 예속부대(隸屬部隊)로 두고 있었다. 따라서 신라는 대당에 군관 60명과 예하(隸下)에 38개 소규모 당급부대(幢級部隊)를 편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대당의 전체 병력수를 전하지 않고 있으며 대당(大幢)에 예속되어 있는 38개 소규모 당급부대(幢級部隊)의 편제와 병력수(編制兵力數)도 역시 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삼국사기 무관조(武官條)의 단편적 기록에만 의존할 경우, 대당의 편제와 전체 병력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대당(大幢)의 전체 병력수를 규명기 위해서는 신라가 대당에 예속되어 있던 38개 소규모 당급부대(幢級部隊)에 각각 편성하고 있었던 병력수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 즉 신라가 38개의 소규모 당급부대(幢級部隊)에 각각 몇 명의 병력을 편성하였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대당(大幢) 뿐 아니라 신라가 서기 660년 보유하고 있었던 36개 부대들의 병력을 규명하기위해서는 이들 부대들에게 예속되어있던 소규모 당급부대들의 편제와 병력수를 밝혀야 한다.
다만 삼국사기가 전(傳)하고 있는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노당(弩幢)의 편제(編制)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이 비교적 체계적이다. 다음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삼국사기는 노당(弩幢)의 편제(編制)에 대한 기록만을 다섯 단계 하부조직까지 비교적 상세히 전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노당(弩幢)에 법당주(法幢主) 15명, 그리고 그 아래 법당감(法幢監) 45명, 법당두상(法幢頭上) 45명, 법당화척(法幢火尺) 45명, 법당벽주(法幢辟主) 135명을 두고 있었다.
노당(弩幢)의 삼국사기 제군관(諸軍官) 기록(記錄)을 분석해 보면 ⌜신라는 일개(一個) 법당(法幢)에 법당의 지휘관이었던 법당주(法幢主) 1명을 두고 그 예하에 법당감(法幢監) 3명, 법당두상(法幢頭上) 3명, 법당화척(法幢火尺) 3명, 법당벽주(法幢辟主) 9명을 배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라가 법당주를 정점으로 법당감, 법당두상, 법당화척, 법당벽주를 계층적 명령체계로 법당(法幢)을 조직하여 운용하고 있었음을 시사(示唆)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 즉 법당조직(法幢組織)의 최하위(最下位) 군관직(軍官職)이었던 법당벽주(法幢辟主)가 몇 명의 병졸을 지휘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고대국가의 부대편제를 감안할 경우 신라의 법당벽주(法幢辟主)가 거느렸던 병졸수(兵卒數)는 오병오당제(五兵五當)에 의하여 일오(一伍)의 병력(5명)이었거나 일십(一什)의 병력(10명)이었을 것이다.
한편 신라와 동시대(同時代)의 중국 고대국가였던 남·북조시대의 제국(諸國)들과 남북조 제국을 통일하였던 수(隋)나라는 [당(幢)]을 부대의 기본단위(基本單位)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남북조시대의 제국과 수나라는 일개(一個)의 당(幢)에 병력 100 명을 편제하고 있었다.⌟ 는 사실은 신라도 일개(一個)의 당(幢)에 병력 100명을 편제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노당(弩幢)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을 분석하여 당(幢)의 병력수가 100명이었음을 증명하였다. [도표 2]에 의하면 신라는 1개 노당에 법당주 1명, 법당감 3명, 법당두상 3명, 법당화척 3명, 법당벽주 9명과 병졸 90명을 편제하고 있었다.
신라가 노당(弩幢)에 편제하였던 군관들은 법(法) 자를 관(冠)한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신라는 이들 법당계열 군관직을 법흥왕대에 대부분 설치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군사당주(軍師幢主)의 설치시기이다. 삼국사기는 신라가 “군사당(軍師幢)을 진평왕 26년(서기 604년)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고 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군사당주(軍師幢主)를 법흥왕 11년(서기 524년)에 설치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는 군사당주(軍師幢主)를 대당(大幢), 상주정(上州停) 등에 1명씩을 편제하였는데, 삼국사기는 신라가 대당(大幢)을 진흥왕 5년(서기 544년)에 처음으로 설치하였고 상주정(上州停)을 진흥왕 13년(서기 552년)에 설치하였다, 고 전하고 있다
. 신라가 대당을 진흥왕 5년에 설치하였다면 대당의 예하 단위부대 지휘관으로 들어갔던 군사당주는 진흥왕 5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군사당주를 진흥왕 5년 이전에 설치하였다면 군사당의 설치시기도 진흥왕 5년 이전이었을 것이다. 삼국사기는 신라가 법흥왕 11년(서기 524년)에 군사당주(軍師幢主)를 설치하였다고 전하는데, 이 기록은 대당의 설치시기를 감안할 경우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신라가 “군사당에 법당화척 30명을 편제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신라가 군사당에 법당화척을 편제군관으로 삼았다는 것은 신라가 법흥왕 11년(서기 524년)에 군사당을 설치하면서 군사당에 법당화척(法幢火尺)이라는 군관을 동시에 편제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흥왕 11년(서기 524년)에 법당화척을 편제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곧 신라가 법흥왕 11년(서기 524년)에 법당계열 군관을 처음으로 설치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가 법당계열 군관직을 법흥왕 대에 설치하였음이 분명해 졌다.
이에 따라 법당계열의 군관들로 편제되어 있던 노당(弩幢)의 설치시기도 법흥왕 대였을 것이다.
앞에서 법당계열(法幢系列)의 군관들로 편제되어 있던 노당(弩幢)의 편제를 복원하였다. 복원한 노당의 편제를 참고로 하여 법당계열의 군관들로 편성되어 있던 다른 소규모 당급부대(幢級部隊)들의 편제를 복원하여 보자.
신라는 백관당(百官幢), 경여갑당(京餘甲幢), 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 외여갑당(外餘甲幢), 여갑당(餘甲幢), 법당(法幢), 외법당(外法幢), 노당(弩幢), 운제당(雲梯幢), 충당(衝幢), 석투당(石投幢), 군사당(軍師幢) 등 12개 당급부대(幢級部隊)에 법당계열(法幢系列)의 군관들을 지휘관과 참모로 편제하고 있었다. 이들 소규모 당급부대(幢級部隊)들의 편제를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백관당(百官幢)의 편제와 병력수(兵力數)
삼국사기는 [제 40잡지 제 9 직관하 무관 제군관(諸軍官)] 조(條)에서 신라가 ⌜백관당(百官幢)에 법당주 30명, 법당감 30명을 편제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반면 백관당(百官幢)에 법당주, 법당감 이외 법당두상(法幢頭上), 법당화척(法幢火尺), 법당벽주(法幢辟主), 전투를 주(主) 임무로 하는 병졸(兵卒) 등을 편제하였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신라가 백관당에 법당주(法幢主) 30명과 법당감(法幢監) 30명만을 편성하여 백관당을 전투에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틀림없이 신라는 백관당에 법당주, 법당감 이외 다른 법당두상, 법당화척, 법당벽주, 전투를 주(主) 임무로 하는 병졸(兵卒) 등을 편제하여 백관당을 전투에 투입하고 임무를 수행도록 하였을 것이다.
앞에서 복원하였던 노당(弩幢)의 편제를 참고로 하면 법당계열의 일개(一個) 소규모 당급부대(幢級部隊)의 병력수(兵力數)는 100명이었다. 백관당도 법당계열의 군관으로 편성되었던 소규모 당급부대였다. 따라서 일개 백관당(百官幢)의 병력수는 100명이었을 것이다.
일개 백관당(百官幢)의 병력수가 100명이었을 경우 30명의 법당주(法幢主)가 거느리고 있었던 30개 백관당(百官幢)의 병력수는 3,000명이었을 것이다. 30개 백관당의 병력수가 3,000명일 경우 [도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법당주(法幢主)의 수(數)는 30명, 법당감(法幢監)의 수(數)는 30명, 법당두상(法幢上)의 수는 60명, 법당벽주(法幢辟主)의 수는 180명이어야 한다.
그리고 법당벽주가 거느리고 있었던 병졸(兵卒)의 수(數)는 14명이어야 한다. 백관당(百官幢)의 병력수 3,000명은 [법당주30 + 법당감30 + 법당두상60 + 법당화척180 + 법당벽주180 + 2,520(병졸수180 × 14 = 2,520명)]을 합한 값이다.
신라는 이 부대 명칭을 백관당(百官幢)으로 칭(稱)하고 있는데 백관당(百官幢)의 백(百)은 100명을 뜻하고 있으며 관(官)은 편제상 제대(梯隊)를 의미하고 있다. 부연(敷衍) 설명하면 고대 일부국가들은 부대를 설치하면서 100명으로 편제된 제대(梯隊)를 관(官)이라고 칭(稱)하였다.
따라서 신라의 백관당(百官幢)은 100명으로 편성된 제대(梯隊)라는 뜻이다. 한편 삼국사기는 백관당 내의 30개 법당을 통합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는 지휘부의 존재를 전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신라가 백관당을 100명 1개 부대로 하는 단위부대로 하여 지방의 군현(郡縣)에 분산·배치하여 운용하였다는 뜻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백관당은 여갑당, 외여갑당, 법당, 외법당과 같은 향토방위조직이었을 것이다. 지방관리였던 현감(縣監)이 이들을 평시와 유사시에 운용하여 향토지역방어를 하였을 것이다.
Ⅱ-3-1-3. 경여갑당(京餘甲幢)의 편제와 병력수(兵力數)
경여갑당(京餘甲幢)은 명칭으로 보아 신라가 서울(王都)일대에 배치하였던 부대였을 것이다. 경여갑당은 법당계열(法幢系列)의 군관들로 구성된 소규모 법당을 예속부대로 거느리고 있었다.
이러한 소규모 법당의 병력수는 100명이었다. 일개(一個) 당(幢)이 100명일 경우 15명의 법당주(法幢主)가 거느리고 있었던 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의 병력수는 1,500명이었을 것이다. 삼국사기는 잡지 직관하 무관 제군관조에서 소경여갑당의 ⌜법당주의 수가 15명이고 법당감의 수 0명, 법당두상 0명, 법당화척 0명, 벽당벽주 0명⌟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제수치는 잘못 전해진 것이다. 신라가 ⌜법당주 15명과, 법당감 0명, 법당두상 0명, 법당화척 0명, 벽당벽주 0명⌟만으로 경여갑당(京餘甲幢)을 조직하여 기본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개 경여갑당(京餘甲幢)의 병력수가 1,500명이 되기 위해서는 법당주의 수가 15명, 법당감의 수가 45명, 법당두상의 수가 45명, 법당화척의 수가 45명, 벽당벽주의 수(數)가 135명이어야 한다. 그리고 법당벽주가 거느리고 있었던 병졸의 수는 9명이어야 한다.
경여갑당(京餘甲幢) 병력수 1,500명은 [법당주 15명 + 법당감 45명 + 법당두상 45명 + 법당화척 45명 + 법당벽주 135명 + 병졸 1,215명(벽당벽주 135 × 병졸 9명) = 1,215]을 합한 값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는 15개 경여갑당을 통합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는 지휘부 조직의 존재를 전하지 않고 있다. 지휘부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라가 경여갑당(京餘甲幢)을 100명 단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뜻한다.
경여갑당(京餘甲幢)의 [여갑餘甲]이라는 명칭은 ⌜남아 있는 갑사(甲士)⌟라는 뜻이며 즉 예비전력임을 의미하고 있다. 예비전력이란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부대를 뜻한다.
소경여갑당(小餘甲幢)은 명칭으로 보아 신라가 소경(小京)에 배치하였던 부대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경(小京)의 향토방위와 동원을 담당하는 예비전력이었을 것이다. 법당계열(法幢系列)의 일개(一個) 당(幢)의 병력수는 100명이었다. 일개(一個) 당(幢)이 100명일 경우 16명의 법당주가 거느리고 있었던 16개 소경여갑당(京餘甲幢)의 병력수는 1,600명이다. 삼국사기는 제군관 조에서 경여갑당의 법당주의 수가 16명이고 법당감의 수 0명, 법당두상 0명, 법당화척 0명, 벽당벽주 0명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제수치는 삼국사기가 잘못 전한 것이다. 신라가 법당주 15명만으로 소경여갑당(京餘甲幢)을 조직하여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개 경여갑당(京餘甲幢)의 병력수가 1,600명이 되기 위해서는 [도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당주의 수가 16명, 법당감의 수가 16명, 법당두상의 수가 32명, 법당화척의 수가 96명, 벽당벽주의 수(數)가 144명이어야 한다. 그리고 법당벽주가 거느리고 있었던 병졸의 수는 9명이어야 한다.
소경여갑당(小餘甲幢)의 병력수 1,600명은 [법당주 16명 + 법당감 16명 + 법당두상 32명 + 법당화척 96명 + 법당법주 144명 + 병졸 1,296(법당벽주 144 × 9 = 1,296명)]을 합한 값이다.
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의 명칭을 고려할 경우 신라는 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을 소경(小京)에 배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는 지증마립간 15년(서기 514년) 봄 정월에 아시촌(阿尸村)에 소경(小京)을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신라는 지증마립간 15년 이후에도 소경을 여러 곳에 설치하였는데, 진흥왕 18년(서기 557년) 국원(國原 : 충북 충주)을 소경(小京)으로 삼았고 진덕왕 8년(서기 639년) 봄 2월에 하슬라주(何瑟羅州 : 江原道 江陵市)를 북소경(北小京)으로 삼았다
. 문무왕 20년(서기 680년) 가야군(加耶郡 : 경남 김해)에 금관소경(金官小京)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신문왕 5년 (서기 685년) 3월에 서원소경(西原小京 : 충북 청주)을 설치하고 남원소경(南原小京 : 全羅北道 南原市)을 설치하고 여러 주와 군의 백성들을 옮겨 그곳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경덕왕 16년(서기 757년)에 남원소경(南原小京 : 全羅北道 南原市)을 다시 설치하였다.
신라는 소경을 혁폐를 수차에 걸쳐하였기 때문에 신라가 16개 소여갑당을 설치하였던 시기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은 소경의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예비전력이었을 것이다.
Ⅱ-3-1-5. 운제당(雲梯幢)의 편제와 병력수
법당계열(法幢系列)의 일개(一個) 당(幢)의 병력수는 100명이다. 일개(一個) 당(幢)이 100명일 경우 6명의 법당주가 거느리고 있었던 6개 운제당(雲梯幢)의 병력수는 600명이다. 6개 운제당의 병력수가 600명일 경우 법당주의 수는 6명, 법당감의 수는 18명, 법당두상의 수는 18명, 법당화척의 수는 18명, 법당벽주의 수는 54명이어야 한다. 그리고 법당벽주가 거느리고 있었던 병졸의 수는 9명이어야 한다.
운제당의 병력수 600명은 [법당주 6 + 법당감 18 + 법당두상 18 +법당화척 18 + 법당벽주 54 + 병졸 486 (법당벽주 54 × 병졸 9 = 486명)]을 합한 값이다. 편제를 고려할 경우 신라는 6개의 운제당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라는 1개 운제당에 법당주 1명, 법당감 3명, 법당두상 3명, 법당화척 3명, 법당벽주 9명을 두었다.
신라가 1개 운제당을 3각 편제(1개 법당주 아래 3명의 법당감과 법당두상, 법당화척을 두었다.)로 구성한 것을 보면 1개 운제당에 3개의 운제를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개 운제에 30명의 병력을 배치하였던 것이다. 운제당은 운제를 전장터까지 운반하기위하여 우마차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운제당은 이러한 운제를 운반하고 전장에서 병사들을 성벽으로 오를 수 있도록 운제를 기술적으로 운용하며 운제를 수리하는 전문기능을 갖춘 부대였을 것이다. 이러한 운제의 편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운제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운용상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공성용 장비였던 운제(雲梯)에 대한 제반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운제(雲梯)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伝)』이나 묵자(墨子)』와 같은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아도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사용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제(雲梯)를 사용하였던 예는 상당히 많았고, 대표적인 공성병기(攻城兵器)로써 청나라 말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묵자(墨子)』에 의하면, 운제(雲梯)를 발명한 사람은 공수반(公輸般)이라고 한다. 공수반(公輸般)은 노나라(지금의 산동성) 출신으로, 건축과 공예 분야에서 천재라고 일컬어져, 후에는 건축과 공예의 신(神)인 노반선사(魯般先師)라고 추앙받은 인물이었다.
그림 1. 운제 운제(雲梯, 그림 1)는 긴사다리를 차에 탑재하여, 공성전(攻城戰)에서 병사들이 성벽을 타고 넘게 하거나, 정찰을 하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르도록 도왔던 장비였다. 운제(雲梯) [그림 1]은 송나라(960∼1279) 시대의 것을 그린 것이다.
큰 나무를 사용해서 바닥과 기둥을 만들고 밑에 6개의 바퀴를 붙였으며 위에 2개의 사다리를 탑재하였다. 이 사다리는 길이가 각각 6m 이상이었다. 병사들이 사다리를 펼쳤을 때 7∼9m의 성벽을 넘을 수가 있었다.
병사들은 사다리의 길이를 공격하는 성의 성벽 높이에 따라 조절하였다. 윗 사다리에는 성벽에 걸치기 위한 갈고리를 붙였고, 사다리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차의 앞뒤에 밧줄을 당기기 위한 도르레를 장치하였다.
운제차의 바깥쪽은 석탄(石彈)이나 불화살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차안에 있는 병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가죽을 부착하였다. 운제차의 이동은 안에 있는 병사에 의해 인력(人力)으로 움직였다. 운제(雲梯)는 사다리가 가동식(可動式)이지만, 송나라는 행천교(行天橋)처럼 긴 사다리를 탑재한 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운제는 구조가 간단하여 고대로부터 공성용 장비로 자주 쓰였다. 사다리는 공격하는 성벽 높이에 맞춰 제작되었다. 고정된 사다리의 윗부분에는 병사를 보호하기 위한 벽이 있었다.
운제(雲梯)는 목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불화살 공격에 취약했다. 그래서 운제(雲梯)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화공에 대해 운제(雲梯)가 타지 않도록 생가죽으로 감싸거나 진흙을 바르는 것이었다.
1m
운제(雲梯)를 이용해서 공격할 때에 당차(撞車, 그림 2)를 이용하기도 했다. 당차(撞車)는 끝부분을 철로 감싼 무거운 나무망치를 탑재한 차이며, 이 망치를 사용해서 운제(雲梯)를 파괴하였다.
또 차우(叉竽, 그림 3)나 저고(抵篙)라고 불리는 장비를 사용하였다, 차우는 사다리를 공격하기 위한 전용의 병기(兵器)였다. 적이 운제(雲梯)나 비제(飛梯)를 성벽에 걸치려고 할 때에, 차우의 날끝과 긴 자루를 사용해서 사다리를 성벽에 걸치기 전에 밀쳐냈다. 이러한 병기는 차(叉)와 같이 대인용(對人用) 병기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
Ⅱ-3-1-6. 충당(衝幢)의 편제와 병력수
법당계열(法幢系列)의 일개(一個) 당(幢)의 병력 수는 100명이다. 일개(一個) 당(幢)이 100명일 경우 15명의 법당주가 거느리고 있었던 12개 충당(衝幢)의 병력 수는 1,200명이다. [도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2개 충당의 병력수가 1,200명일 경우 법당주의 수는 12명, 법당감의 수는 12명, 법당두상의 수는 48명, 법당화척의 수는 48명, 법당벽주의 수는 108명이어야 한다. 그리고 법당벽주가 거느리고 있었던 병졸의 수는 9명이어야 한다.
충당(衝幢)의 병력수 1,200명은 [법당주 12 + 법당감 12 + 법당두상 48 + 법당화척 48 + 법당벽주 108 + 병졸수 1080 (법당벽주 108 × 병졸 9 = 972명)]을 합한 값이다.
충당(衝幢)은 충차(衝車)를 전문으로 운용하는 부대였다. 상기 충당의 편제를 고려할 경우 신라는 12개의 충당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라는 1개 충당에 법당주 1명, 법당감 1명, 법당두상 4명, 법당화척 4명, 법당벽주 9명을 두었다.
충차(衝車)의 규모로 보아 신라는 1개 충당(衝幢)에 1개의 충차를 배치하였을 것이다. 즉 1개 충차에 100명의 병력을 배치하였던 것이다. 신라가 1개 운제당을 4각 편제(1개 법당주 아래 4명의 법당두상, 법당화척을 두었다.)로 구성한 것을 보면 충당은 충차를 전장터까지 운반하고, 전장터에서 운용하기 위하여 충당의 병력을 4개의 기능분야로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충당은 이러한 충차를 운반하고 전장에서 선두에서 성벽의 여장(女墻)을 파괴하여 보병들이 성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충차를 기술적으로 운용하며 충차를 수리하는 전문기능을 갖춘 부대였을 것이다. 이러한 충당의 편제를 명확히 이해하기위해서는 충차(衝車)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운용상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공성용 장비였던 충차(衝車)에 대한 제반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충차(衝車)는『묵자(墨子)』에서 기록된 것처럼, 춘추․전국시대에 출현하였고 많은 공성전(攻城戰)에서 사용되었다. 충차(衝車)의 규모는 [그림 4]과 같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아주 큰 것도 있었다. 당나라 시대인 783년, 봉천(奉天, 지금의 협서성)의 공성전(攻城戰)에서 사용된 운교(雲橋)는 폭이 약 100m 이상이나 되어 바깥쪽은 젖은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방화(防火)를 위해 물을 채운 가죽주머니를 달아 놓았었다. 그 때문에 운교(雲橋)에는 돌이나 화살, 불화살조차 소용이 없었다.
그림 4. 충차 충차(衝車)는 임충(臨衝)이나 대루(對樓)라고도 불리며 장갑(裝甲)으로 된 공성탑(攻城塔)을 뜻한다. 임충여공차(臨衝呂公車, 그림 3)는 명나라『무비지(武備志)』에 나오는 것으로 8개의 바퀴가 달린 5층짜리 공성탑(攻城塔)이다. 맨 아래층에는 임충여공차(臨衝呂公車)를 밀어 움직이는 병사가 있고, 다른 4개 층에 전투를 하는 병사가 탑승하였다. 이 책(무비지)에서는 높이가 약 12m, 폭이 약 6m, 길이가 약 8m로 추정되지만, 높이는 공격하는 성벽의 높이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만들어졌다. 충차(衝車)는 그 높이와 안에 탑재한 병기를 사용하여 성내를 사격하거나, 성벽에 접근하여 여장(女墻:성벽위의 사격용 담장)을 파괴해서 성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충차에 탑재하였던 병기에는 각종 장병기(長兵器)외에 대형의 노(弩) 또는 포(砲)를 싣기도 하였다. 성벽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에는, 성벽의 여장(女墻)을 파괴하는 당목(撞木)이나, 충차(衝車)의 윗부분이나 정면에 성벽으로 건너기 위한 천교(天橋)라는 접이식 다리가 달린 것도 있다.
충차(衝車)에 대한 공격 방법으로는 강력한 노(弩)나 포(砲)를 사용해서 안에 있는 병사를 제압하는 방법, 또는 불화살이나 송진을 바른 긴장대로 태워버리는 방법, 그리고 무거운 돌이나 나무로 파괴하는 방법이 있었다.
Ⅱ-3-1-7. 석투당(石投幢)의 편제와 병력수
법당계열(法幢系列)의 일개(一個) 당(幢)의 병력수는 100명이다. 일개(一個) 당(幢)이 100명일 경우 15명의 법당주가 거느리고 있었던 12개 석투당(石投幢)의 병력 수는 1,200명이다. [도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2개 석투당의 병력수가 1,200명일 경우 법당주의 수는 12명, 법당감의 수는 12명, 법당두상의 수는 48명, 법당화척의 수는 48명, 법당벽주의 수 108명이어야 한다. 그리고 법당벽주가 거느리고 있었던 병졸의 수는 9명이어야 한다.
석투당(石投幢)의 병력수 1,200명은 [법당주 12 + 법당감 12 + 법당두상 48 + 법당화척 48 + 법당벽주 108 (병졸수 108 × 9 = 972명)]을 합한 값이다.
석투당(石投幢)은 포차(砲車)를 전문으로 운용하는 부대였다. 상기 석투당(石投幢)의 편제를 고려할 경우 신라는 12개의 석투당(石投幢)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라는 1개 석투당에 법당주 1명, 법당감 1명, 법당두상 4명, 법당화척 4명, 법당벽주 9명을 두었다.
석투당(石投幢)의 규모로 보아 신라는 1개 석투당(石投幢)에 1개의 포차(砲車)를 배치하였을 것이다. 즉 1개 포차에 100명의 병력을 배치하였던 것이다. 신라가 1개 석투당을 4각 편제(1개 법당주 아래 4명의 법당두상, 법당화척을 두었다.)로 구성한 것을 보면 석투당(石投幢)은 포차를 전장터까지 운반하고 전장터에서 운용하기 위하여 석투당(石投幢)의 병력을 4개의 기능분야로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석투당(石投幢)은 이러한 포차를 운반하고 전장에서 성벽의 성벽을 파괴하여 보병들이 성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포차를 기술적으로 운용하며 포차를 수리하는 전문기능을 갖춘 부대였을 것이다. 이러한 석투당(石投幢)의 편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차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운용상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사상 최초로 포가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후한 말이었던 A.D. 200년에 조조와 원소(袁紹)가 싸웠던 관도(官渡)전투에서였다. 원소군은 병력면에서 조조군에 비해 우세했지만, 조조군이 구축했던 진지가 견고해서 양측 모두 어찌할 수 없는 상태였다. 원소군은 조조군의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 토산(土山)을 쌓고, 그 위에 고루(高樓)를 올려서 노(弩)를 갖고 조조군의 진지에 화살로 공격했었다.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고심하던 조조는 부하의 제안을 채용해서 발석차(發石車)를 만들어 원소의 고루(高樓)를 전부 파괴하는데 성공했다. 발석차(發石車)는 그 위력이 대단해서 벽력차(霹靂車)라고도 불렸다.
그림 5. 포차
수·당시대에 들어서자 공성전에 포(砲)가 자주 사용되었다. 포(砲)라는 것은 발사할 때에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지렛대의 원리로 탄환을 발사하는 투석기를 말한다. 포(砲)는 기본적으로 지렛대에 상당하는 목제로 만든 초(梢)라고 하는 부분과, 목제 축(軸), 축(軸)을 지지하는 목제 각주(脚柱), 초(梢)의 한쪽 끝에 마(麻)로 만든 견인줄, 그 반대편에는 석탄(石彈)을 장전하기 위한 정이 박힌 가죽이 마(麻)로 만든 줄로 연결되어 있다.
가장 많은 종류의 포가 등장했던 송나라에는 수포(手砲), 합포(合砲), 단초포(單梢砲), 쌍초포(双梢砲), 선풍포(旋風砲), 호준포(虎蹲砲), 오초포(五梢砲), 칠초포(七梢砲), 13초포(十三梢砲) 등이 있었다. [그림 5]는 칠초포이다. 4개의 각주(脚柱)의 높이는 약 6.5m이고, 초(梢)는 길이 8.6m짜리 4개와 7.7m짜리 3개를 합친 것이다. 견인줄의 가닥수는 125개로 길이는 약 15.4m이다. 포 1문의 조작요원은 252명으로, 견인줄 1가닥을 2명이 잡아당기며, 2명이 조준을 하고 발사를 지시하였다. 사거리는 약 54∼60kg의 석탄(石彈)을 발사하는 경우에 약 71m이상이며 400m까지도 나갔다.
Ⅲ. 맺 음 말
본론에서 신라가 무열왕(武烈王) 7년(서기 660년)에 보유하고 있었던 부대들의 편제와 병력수를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가 대백제전(對百濟戰)에 투입하였던 부대명칭(部隊名稱)과 총병력수(總兵力數)를 산출하였다.
신라(新羅)가 무열왕(武烈王) 7년(서기 660년)에 보유하고 있었던 부대수는 36개 부대였다. 이러한 36개 부대들의 편제와 병력수는 앞 장에서 밝힌 바와 같다. 그리고 36개 부대 가운데 신라가 무열왕 (武烈王) 7년(서기 660년)에 대백제전(對百濟戰)에 투입(投入)하였던 부대수(部隊數)는 20개 부대였다. 20개 부대명칭은 다음과 같다.
즉 ①대당(大幢), ②상주정(上州停), ③하주정(下州停), ④서당(誓幢), ⑤낭당(郎幢), ⑥음리화정(音里火停), ⑦삼량화정(參良火停), ⑧소삼정(召參停), ⑨남천정(南川停), ⑩이화혜정(伊火兮停), ⑪계금당(罽衿幢), ⑫군사당(軍師幢), ⑬노당(弩幢), ⑭운제당(雲梯幢), ⑮충당(衝幢) ⑯석투당(石投幢), ⑰귀당, ⑱시위부(侍衛府), 1사자금당(獅子衿幢), 2수군(水軍) 등이었다.
이 20개 부대 가운데 왕을 호종하고 숙위하였던 시위부와 왕궁을 경비하였던 사자금당을 제외하면 대백제전에 투입하였던 순수한 전투부대 수는 18개에 이른다.
신라가 서기 660년에 보유하고 있었던 36개 부대의 총병력수(總兵力數)는 106,357명이었다. 그리고 신라가 대백제전에 투입하였던 20개 부대의 총병력수는 60,620명이었다. 그런데 60,620명 가운데 무열왕을 호종(扈從)하는 시위부(侍衛府 : 180명)와 왕궁(王宮)을 경비하는 사자금당(獅子衿幢 : 3,000명)을 빼면 신라가 전투에 투입하였던 부대수는 18개이며, 18개 부대의 병력수는 57,440명이다.
신라(新羅)가 대백제전(對百濟戰)에 투입하였던 57,440명 가운데 지상군(地上軍)은 48,340명이었으며 수군(水軍)은 9,100명이었다. 그리고 수군(水軍) 9,100명 가운데 전투병력(戰鬪兵力)은 2,602명이었으며 비전투병력(非戰鬪兵力)은 6,498명이었다. 지상군(地上軍) 48,340명과 수군(水軍)의 전투병력(戰鬪兵力) 2,602명을 합하면 신라가 대백제전에 투입하였던 지상전투병력(地上戰鬪兵力)은 50,942명이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는 신라본기(新羅本紀) 제5 무열왕 7년(서기 660년) 조(條)에서 "왕(王)은 태자(太子)와 대장군 유신(庾信), 장군 품일(品日)과 흠춘(欽春) 등에게 명하여 정예군사 5만명(五萬名)을 거느리고 그것에(당나라 소정방의 대백제전쟁) 부응하도록 하고, 왕은 금돌성(今突城)에 가서 머물렀다."라고 전하고 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신라는 정예 5만명(五萬名)을 거느리고 대백제전에 부응하였다.⌟는데 이 5만명(五萬名)이라는 병력수(兵力數)는 신라가 대백제전에 투입하였던 지상군 병력수 48,340명을 지칭하였던 것이거나, 또는 지상병력(地上戰鬪兵力)과 수군의 전투병력을 합친 50,942명을 지칭하였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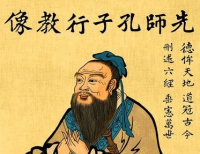 세상에 쓰인다면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고 ,,,
공자[孔子]께서 안연[顔淵]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 나서 쓰인다면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고 만일 쓰이지않는다면 자신의 재능을 감출수 있어야 하거늘 아마도 너와 나만이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다, 용지측행 [用之則行] 사지측장 [舍之則藏]유아여이...
세상에 쓰인다면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고 ,,,
공자[孔子]께서 안연[顔淵]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 나서 쓰인다면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고 만일 쓰이지않는다면 자신의 재능을 감출수 있어야 하거늘 아마도 너와 나만이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다, 용지측행 [用之則行] 사지측장 [舍之則藏]유아여이...
 상월면 주내 사거리 흉물 방치 폐가 마침내 철거
십 수년을 두고 흉뮬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돼 오가는 길손들의 빈축을 샀던 논산시 상월면 주내 사거리 빈집에 대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2,3일 후면 말끔히 정비될 전망이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라도 토지주를 설득 철거에 나선...
상월면 주내 사거리 흉물 방치 폐가 마침내 철거
십 수년을 두고 흉뮬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돼 오가는 길손들의 빈축을 샀던 논산시 상월면 주내 사거리 빈집에 대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2,3일 후면 말끔히 정비될 전망이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라도 토지주를 설득 철거에 나선...
 시민공원 족욕체험장 " 인기몰이" 시민들 반색
논산시가 공설운동장과 시민공원 사이 녹지공간에 마련한 족욕 체험장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당초 야외 족욕 체험시설로 출발한 체험장은 날씨가 추운 동절기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바람막이 외벽과 비가림 시설을 완비하면서 부...
시민공원 족욕체험장 " 인기몰이" 시민들 반색
논산시가 공설운동장과 시민공원 사이 녹지공간에 마련한 족욕 체험장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당초 야외 족욕 체험시설로 출발한 체험장은 날씨가 추운 동절기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바람막이 외벽과 비가림 시설을 완비하면서 부...
 10월 12일 강경 젓갈축제 3일차 표정 [2]
강경 포구 둔치에서 열린 2018년도 강경 젓갈축제 3일차 표정을 한광석 굿모닝논산 사진 편집위원이 카메라에 담았다,
10월 12일 강경 젓갈축제 3일차 표정 [2]
강경 포구 둔치에서 열린 2018년도 강경 젓갈축제 3일차 표정을 한광석 굿모닝논산 사진 편집위원이 카메라에 담았다,
 여걸[?]의; 등장 ,이인제 도지사 후보 부인 김은숙 씨
충남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한 이인제 예비후보의 부인 김은숙 씨가 어린이날을 기념한 논산시 어린이 큰잔치가 열리는 시민공원을 찾아 시민들에게 이인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김은숙 여사의 논산 방문 일정에는 자유한국당 논산시의원 비례...
여걸[?]의; 등장 ,이인제 도지사 후보 부인 김은숙 씨
충남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한 이인제 예비후보의 부인 김은숙 씨가 어린이날을 기념한 논산시 어린이 큰잔치가 열리는 시민공원을 찾아 시민들에게 이인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김은숙 여사의 논산 방문 일정에는 자유한국당 논산시의원 비례...

